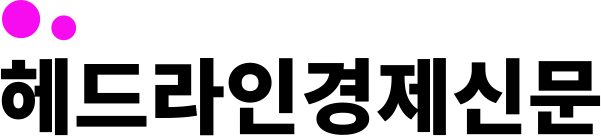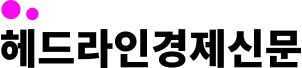그 전쟁은 먼 대륙에서 시작되었다.
유럽의 거리엔 철모가 보였고,
도시엔 깃발이 나부꼈고,
기차는 병사들을 싣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다시 절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한때 평화를 말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고요한 대지 위엔 부서진 건물의 잔해만 남았다.
미국은 그 전쟁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지난 전쟁을 기억하고 있었고,
다시는 외국의 피비린내 속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고립은 이념이 되었고,
중립은 방패가 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나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아침의 햇살이 해안선을 비추던 그때,
하늘엔 낯선 비행기들이 나타났고,
포탄은 순식간에 바다를 뒤집었다.
배가 기울었고, 불길이 솟았으며,
그날 수천 명이 죽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다음 날, 루스벨트는 의회에서 말했다.
“12월 7일, 수치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세계의 전쟁터에 들어섰다.
전쟁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배낭을 꾸렸고,
공장은 총과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동차 대신 탱크가 조립됐고,
가정의 냄비는 고철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고철을 모았고,
어머니들은 탄약을 포장했고,
남편은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었다.
미국은 이제 ‘무기고’였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철과 불, 연료와 병사를
쉴 새 없이 공급하는 거대한 기계가 되었다.
유럽에선 노르망디 상륙이 이루어졌고,
아프리카 사막에선 별들이 병사들을 지켜보았다.
태평양에서는 산호해와 필리핀 바다에
잠수함과 전함이 격돌했다.
그러나 전쟁은 단지 군사적 충돌이 아니었다.
전쟁은 가치의 충돌이었다.
자유와 폭압, 민주주의와 독재,
그 단어들이 이제는 총과 칼 위에 얹혀 있었다.
루스벨트는 네 가지 자유를 말했다.
말할 자유, 신앙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선언이었고,
전쟁의 목적이 되었으며,
미국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러는 사이,
집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흑인 병사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향에서는 여전히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일본계 미국인들은 수용소에 보내졌다.
그들의 시민권은 전쟁 앞에서 가벼워졌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나라가
자신 안의 모순을 마주해야 했던 시절.
그리고 1945년.
전쟁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독일은 무너졌고, 히틀러는 숨었으며,
유럽의 밤은 조용해졌다.
그러나 태평양은 아직 불타고 있었다.
그때, 미국은 새로운 무기를 꺼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빛보다 먼저 온 열과 바람이
도시 하나를 날려버렸고,
세상은 처음으로
전쟁의 끝을 두려움으로 마주했다.
8월 15일.
전쟁은 끝났고,
총은 내려졌으며,
기억만이 남았다.
수백만의 생명이 사라졌고,
수많은 도시가 폐허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전쟁은 미국을 바꾸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딴 대륙의 국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유일한 원자폭탄 보유국이 되었으며,
‘초강대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제 미국은
자신의 내면뿐 아니라
세상의 질서까지 고민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승리의 기쁨은 짧았고,
그 기쁨 아래에
전혀 다른 냉기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이름은 소련이었고,
그 감정은 ‘동맹’이 아닌 ‘경계’였다.
총성은 멈췄지만,
또 다른 전쟁이
말없이 시작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