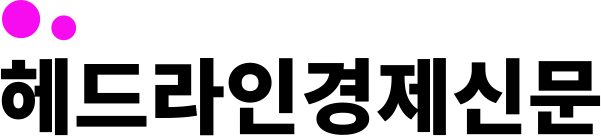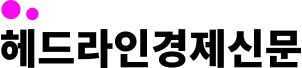여름이었다. 그리고 그 여름은 그들 생애 가장 조용하지 않은 여름이었다. 땅 위에 흩어진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녔던 소속과 습관, 말과 법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이 한때 경외심으로 바라보던 왕은, 이제는 먼섬 彼岸에 앉아 세금과 명령만을 보낼 뿐이었다.
왕의 문장은 더 이상 권위가 아니었고, 의회의 결정은 식민지 사람들의 고통 위에 올라앉은 듯했다.
1776년 7월. 필라델피아.
한 회의실 안, 문이 닫히고, 창문 사이로 더운 바람이 들어왔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한 문서가 조용히 읽혀졌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는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방 안의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종이는 가벼웠지만, 그 말은 무거웠다. 그 말은 전쟁을 뜻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출발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과거의 복종과 현재의 불만 사이, 그들은 미래를 걸고 결단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대지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농부들은 총을 들었고, 대장장이들은 칼을 만들었으며, 인쇄소에서는 ‘자유’라는 글자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소책자 하나하나가 총알처럼 날아들었고, 거리의 벽마다 낡은 규율 대신 새로운 구호가 붙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름도, 깃발도, 국경도 없는 나라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들의 군대는 훈련되지 않았고, 보급은 늘 부족했다.
식민지 청년들의 군화 밑창은 겨울비에 젖어 떨어졌고, 그들의 손은 굳은살보다 상처가 먼저 박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조지 워싱턴이 있었다.
워싱턴은 말이 적었고, 조용했고, 몸가짐이 단정했다.
그는 한 마디로 군대를 움직였고, 눈빛 하나로 병사들의 사기를 붙들었다.
그가 설원 위를 걸어가면, 누군가는 그 발자국 위를 따랐고, 누군가는 그 등을 바라보며 총을 들었다.
그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영웅이 되었다.
전쟁은 생각보다 길었고, 끝은 보이지 않았다.
해마다 봄이 와도 전선은 풀리지 않았고, 가을마다 또다시 포성이 울렸다.
하지만 그들의 곁에는 프랑스가 있었다.
왕정의 모순과 계몽의 기운이 부딪히던 그 대륙에서, 미국의 혁명은 하나의 이상처럼 보였다.
프랑스는 은밀히, 그리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미국을 지원했다.
무기와 군함이 대서양을 건넜고, 워싱턴의 부대는 더는 고립되지 않았다.
1781년, 요크타운.
영국군이 항복했다는 소식은 바람보다 먼저 마을을 휘돌았다.
그날 밤, 어떤 마을에선 불꽃이 올랐고, 어떤 가정에선 조용히 기도가 울렸다.
노예들은 초승달이 뜬 밭가에 서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고, 농부들은 총을 내려놓고 씨앗을 다시 움켜쥐었다.
그러나 국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178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었다.
영국은 마지못해 미국의 독립을 인정했다.
그러나 평화는 이름뿐이었다.
연합된 13개 주는 이름만 연합일 뿐, 서로 다른 화폐와 법률, 심지어 군대까지 따로 갖고 있었다.
식민지의 독립은 곧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었다.
자유는 가졌지만, 질서가 없었고, 땅은 넓었지만, 중심은 없었다.
그때, 펜을 든 이들이 다시 나타났다.
제임스 매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지만, 더 치열한 전투를 준비했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연방 정부의 필요성과 헌법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었다.
그들은 썼다. 글로 싸웠고,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들의 문장은 구호가 되었고, 신문은 무대가 되었으며, 인쇄된 활자는 국민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787년, 필라델피아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엔 총이 아닌 법을 들고.
헌법이 논의되었고, 수정되었고, 서명되었다.
권력은 세 갈래로 나뉘었고, 그 권력 위에는 국민의 뜻이 놓였다.
그날, 땅에는 새로운 규칙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1789년, 새로운 시대의 첫 이름이 등장했다. 조지 워싱턴.
그는 말없이 취임했고, 말없이 통치했다.
그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권력은 절제되었으며, 법은 침묵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나라를 가졌고, 법을 가졌고, 국기를 올릴 깃대를 세웠다.
그러나 진짜 나라는, 이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머릿속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다.
자유란 무엇인가.
권리란 어디까지인가.
이 새로운 ‘미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그 질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은, 그 질문들을 끌어안은 채
다음 시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