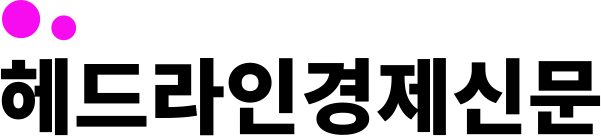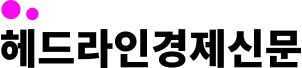사람들은 낡은 깃발을 내리고, 새로운 별을 달기 시작했다.
그 별은 하나의 빛이 아니라, 열세 개의 빛이었다.
각기 다른 땅과 이익, 전통과 방식을 가진 주들이, 겨우 하나의 이름을 공유하며
미국이라는 실험을 시작했다.
1789년 봄,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상징이 되었으며, 곧 제도가 되었다.
백마를 타고 도시에 입성하지 않았고, 사치를 걸치지도 않았다.
그는 왕이 아니었기에 더욱 존경받았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가 앉은 자리는 단정했고, 조용했다.
수도는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로 옮겨졌다.
강변의 땅에 흙과 돌을 얹고, 건물을 올리며 사람들은 ‘국가’라는 개념에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미완성이었고, 거리엔 진흙이 많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가 나라를 지켜줄 거라는 희망을.
그러나 나라는 하나였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둘 이상이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중앙정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고,
토머스 제퍼슨은 주(州)의 자율과 농민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담백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철학과 계급, 도시와 농촌, 금융과 토지라는 오래된 균열이 숨겨져 있었다.
정당이라는 것이 생겼다.
연방당과 공화민주당.
말이 달라졌고, 신문은 편을 들기 시작했다.
표는 사람을 뽑는 수단이 되었고,
정치는 그때부터 생겼다.
미국은 동시에 커지고 있었다.
1790년대, 애팔래치아 산맥을 넘은 개척민들이 서부로 향했다.
도로는 없었고, 지도는 비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땅을 믿고 나아갔다.
루이지애나 땅을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해,
그 면적은 두 배가 되었고, 미국은 이제 대륙 국가가 되려 하고 있었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
그는 책보다 농사를 좋아했고, 연설보다 침묵을 사랑했으며,
자유와 자연 속에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진다고 믿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미국을 남쪽으로, 서쪽으로, 바깥으로 밀어냈다.
그 시절의 미국은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 같았다.
외국과의 갈등은 있었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국내의 정치는 격렬했지만, 피는 흐르지 않았다.
그러나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잊혀졌던 총과 대포가 다시 꺼내졌고, 북부의 도시들은 불안에 떨었다.
워싱턴 D.C.는 불탔고, 백악관은 시커먼 재로 변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의 단단함을 시험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 전쟁은 결국 끝났다.
영토는 지켜졌고, 국기는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전쟁 이후, 비로소 자신들의 국가가 이제 하나의 정신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이제 미국은 독립된 국가를 넘어서, 독립된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1815년 이후, ‘좋은 감정의 시대(era of good feelings)’라는 말이 생겼다.
정당 간의 싸움이 잠시 사라졌고, 경제는 성장했고,
국민들은 이전보다 ‘우리’라는 감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평화 속에도 금이 있었다.
경제는 도시와 농촌을 나누었고,
남부의 플랜테이션은 노예 노동에 더욱 의존하기 시작했다.
북부는 기계와 공장을 세웠고,
사람들은 점점 더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
서부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별 아래서 잠들었고,
동부의 상공업자들은 유리창 너머로 세계를 내다보았다.
같은 국기를 달고 있지만,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 시절의 미국은
처음으로 ‘하나의 국가’로 불릴 수 있었다.
전쟁과 논쟁, 확장과 실패 속에서
그들은 점점 더 미국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대지는 여전히 넓었고, 정치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헌법은 살아 있었고, 사람들은 법 아래서 숨 쉬었다.
그 시절은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살 아래,
더 큰 전쟁과 더 깊은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국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하나의 집처럼 들리기 시작한 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