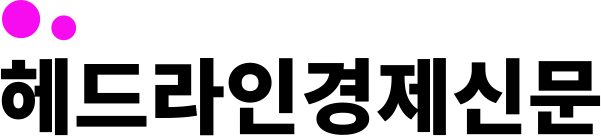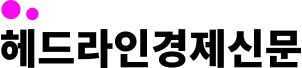그들은 대지를 더 넓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먼 평원과 높고 하얀 산맥, 지평선 너머로 지는 태양은
이제 단지 자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회였고, 땅이었고, 신이 내린 권리처럼 여겨졌다.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말이 생겼다.
사람들은 그 말에 매달려 서쪽으로 떠났다.
지도가 없는 곳에 길을 내고, 숲을 밀고, 땅에 말뚝을 박았다.
소를 몰고, 가족을 이끌고, 총을 지닌 채 그들은 이동했다.
모닥불 곁에서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옛집을 그리워했으며,
누군가는 이름 없는 계곡에 묻혔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땅 위에 정착지를 세웠고, 정착지는 마을이 되었으며,
마을은 주가 되었다.
1830년대, 앤드루 잭슨.
그는 거칠었고, 직접적이었으며, 민중의 대통령이라 불렸다.
그는 법보다는 의지를 믿었고, 귀족보다는 평민의 표를 따랐다.
그의 통치는 사랑받았고,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인디언들을 밀어냈다.
“눈물의 길”이라 불리는 강제 이주는,
체로키 족의 발자국 위에 눈물과 뼈를 남겼다.
사람들은 길을 만들었지만, 그 길 위엔 슬픔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지는, 정복의 방식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영토가 넓어질수록
그 내부는 더욱 조용하지 않았다.
남부는 면화와 노예로 번영하고 있었다.
플랜테이션은 커졌고, 그 안의 사람들은 작아졌다.
흑인들은 이름 없이 일했고, 노래 없이 울었으며,
법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북부는 달랐다.
공장과 철도, 학교와 신문이 늘어났고,
노예제에 대한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다.
정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여론 속에서 움직였고,
노예제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그러나 남부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들의 세계엔 전통과 이익이 얽혀 있었고,
그것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미주리 협정,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안, 도망노예법.
법은 갈등을 봉합하려 했지만,
그것은 실밥 없는 상처에 덮는 거즈에 불과했다.
국회는 갈라졌고, 언론은 격렬해졌으며,
거리의 담장에는 정치인의 이름과 함께
서로를 향한 분노가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그 와중에 한 노예가 도망쳤다.
그의 이름은 프레더릭 더글러스였고,
그의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글을 썼고, 연설을 했으며,
자유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한 여인은 책을 썼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
그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눈물을 불러왔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의 분기점을 남겼다.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
전쟁은 미국의 국경을 리오그란데까지 밀어붙였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지도 위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 넓어진 땅은 또다시 갈등을 키웠다.
“이 새로운 땅에 노예제를 둘 것인가?”
이 질문은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균열이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느끼기 시작했다.
이 나라의 북과 남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서쪽으로는 땅이 넓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1850년대.
미국은 더 이상 ‘한 나라’라고 부르기 어려워졌다.
자유주와 노예주, 상업과 농업, 이념과 전통.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나라가 살고 있는 듯했다.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
한 흑인이 자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는 시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정의의 문을 닫았고,
그 문 앞에 많은 이들이 멈춰 섰다.
그리고 1860년.
한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키가 컸고, 말이 조용했고,
마음에 정의를 품은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그의 등장은,
이 나라를 갈라놓는 마지막 서막이었다.
이제 전운은 들판을 넘어 도시로 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서 대화 대신 분노를 나누었고,
신문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기 시작했다.
길어진 그림자 아래,
미국은 다시 전쟁을 향해 걷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