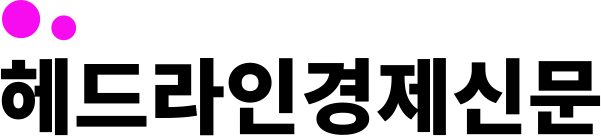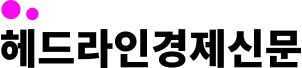총성이 울리기 전, 세상은 늘 조용하다.
전운은 대화의 마지막 어미에서 느껴졌고,
신문의 행간에서, 기차역의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가 곧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1861년 4월.
남부의 포탄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섬터 요새에 떨어졌다.
그 한 발이 미국이라는 집의 지붕을 찢었고,
북과 남은 더 이상 한 나라로 불릴 수 없게 되었다.
전쟁은 선언보다 먼저 현실이 되었고,
의심은 증오가 되었으며,
동료였던 이웃은 적군이 되었다.
북부는 연방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다.
남부는 자신들의 권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 중심에는 노예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그것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국가의 권리’, ‘자유의 보호’, ‘침해에 대한 저항’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 모든 단어 밑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체제.
에이브러햄 링컨은 조용히 전쟁을 지휘했다.
그는 슬픈 눈을 가졌고,
말보다는 글로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게티즈버그 전투 이후,
그는 짧은 연설을 남겼다.
단 272개의 단어로 그는 민주주의를 정의했고,
그 말은 대포보다 강하게 퍼져나갔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길었다.
1862년, 남부의 총검은 아직 예리했고,
북부의 군화는 진창 속에서 무거웠다.
그러나 시간이 북을 도왔다.
공장과 철도, 인구와 자본.
북부는 천천히 남부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63년.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다.
그 선언은 남부의 노예들을 당장 자유롭게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의 의미를 바꾸어놓았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영토나 체제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되었다.
남부의 군대는 끝까지 저항했다.
그들의 장군, 로버트 E. 리는 품위 있었고, 용맹했으며,
종종 적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군사적 재능은 기근과 질병, 피로 앞에서 약해졌다.
1865년 4월.
버지니아 애퍼매턱스.
로버트 리는 북군의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했다.
그날의 문서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그저 지친 이들이 펜을 들어 전쟁을 끝낸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승리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며칠 뒤, 링컨은 암살당했다.
그의 죽음은 전쟁이 남긴 마지막 총성이었다.
재건(再建)의 시간이 왔다.
무너진 도시, 찢긴 마음, 그리고 해방된 수백만의 흑인들.
그들을 어떻게 새로운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총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다.
북부는 남부를 군정으로 다스렸고,
새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흑인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했고,
학교와 교회가 세워졌으며,
자유는 이제 가시적인 형체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부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쿠클럭스클랜이라는 이름 아래,
밤마다 불이 지펴졌고,
새벽마다 누군가는 침묵 속에 쓰러졌다.
법은 존재했지만, 사람들은 법 위에 선 채로
다시 구 질서를 불러들이고 있었다.
재건의 이상은 곧 피로로 바뀌었고,
1877년. 북부는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했다.
그 순간, 다시금 남부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사회를 재구성했다.
흑인들은 투표소에서 밀려났고,
학교는 분리되었으며,
법은 흑백을 나누는 도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돌이킬 수 없었다.
노예제는 폐지되었고,
헌법은 평등을 언어로 담았으며,
흑인들은 이제 더는 ‘재산’이 아닌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전쟁은 끝났고,
재건은 끝났으며,
이제 미국은 또 다른 시대로 걸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 길은 산업으로, 기계로, 자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깊은 밑바닥에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나라를 다시 지었지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하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
또 다른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