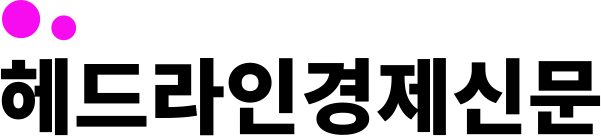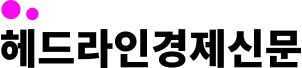세상은 위기를 싫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위기를 가장 잘 이용하는 존재가 하나 있다. 바로 달러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달러를 찾는다. 전쟁이 터져도, 금융시장이 요동쳐도, 각국 통화가 흔들려도 유일하게 강해지는 통화가 있다면 그것 역시 달러다. 이 역설적인 현상은 단순한 신뢰의 문제가 아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달러가 강해지는 구조에는 경제의 근본적인 권력 관계가 숨어 있다.
달러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다. 각국의 무역 결제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자본 이동 역시 달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국가가 물건을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준비해야 한다. 이 구조는 수십 년간 고착화되어 왔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달러를 찾는다. 다른 통화는 불안하지만, 달러는 마지막 남은 안전지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전지대는 미국 경제의 강점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른 통화들이 신뢰를 쌓는 데 실패한 시간들이 쌓여 달러의 안전성을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
위기의 순간 달러가 강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달러 부채 때문이다. 신흥국 기업과 정부는 달러로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오르거나 위험이 커질 때마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찾아야 한다. 빚을 갚으려는 행동 자체가 달러 수요를 높이고, 그 수요가 다시 달러 가치를 끌어올린다. 달러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세계 경제의 구조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수요가 폭발하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 공포가 높아질수록 달러의 역할은 더 커진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달러가 왜 다른 통화와 달리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달러 강세는 종종 미국 경제의 강함으로 오해되지만, 실은 세계 경제의 취약함이 비치는 그림자이기도 하다. 세계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의 자산이 빠져나와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 미국 국채는 위기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이는 곧 달러 수요로 이어진다. 미국은 누구보다 강력한 안전자산을 보유한 국가다. 세계가 불안해진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재무부 채권을 더욱 매력적인 자산으로 만들고, 이는 다시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린다. 마치 공포가 커질수록 달러를 위한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조가 반드시 지속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다. 달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과했다. 금융위기, 전쟁, 팬데믹, 세계적 인플레이션. 하지만 달러의 힘은 단순히 미국의 경제력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엮인 금융 시스템의 관성에서 나온다. 이 관성이 약해지는 순간, 다른 통화가 부상할 여지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달러를 대체할 만큼의 안정과 신뢰를 제공하지 못했다. 위기의 순간 더 많은 달러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존재하는 한, 달러의 시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달러 강세는 결국 세계가 느끼는 불안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가장 익숙한 안전지대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통화다. 공포가 달러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은 달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세계가 아직 다른 선택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전쟁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경제는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움직이며, 기술 변화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기준점을 찾으려고 한다. 달러는 그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세계가 흔들릴수록 달러가 강해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달러의 힘은 세계 경제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가 얼마나 많은 불안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달러는 계속해서 강해질 것이다. 달러의 힘은 신뢰의 상징이 아니라, 불안의 총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