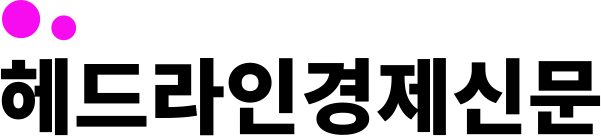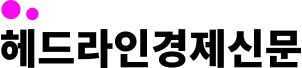추석이 다가온다. 달빛이 원을 그리듯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집을 향해 모인다. 이 시기마다 반복되는 준비의 풍경은 어쩌면 해마다 같으면서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마트의 진열대에는 과일이 묶음으로 포장되고, 온라인몰의 화면에는 ‘프리미엄 세트’라는 문구가 빛난다.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채우며 망설인다. 무엇을 고르는 것이 적당할까, 어느 선에서 멈추는 것이 지혜로울까. 선물은 언제나 단순한 물건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

추석 선물은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언어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정을 대신 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부모에게 건네는 선물은 지난 한 해의 무사함에 대한 보고이자 안부다.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전하는 작은 정성은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기호가 된다. 하지만 이 언어는 늘 균형을 요구한다. 너무 가볍게 준비하면 성의가 부족해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게 건네면 부담이 된다. 사람들은 그 미묘한 선을 가늠하며 상점의 진열대 앞에 선다.
이 무게의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오히려 선물에 담긴 맥락과 의미가 더 중요하다. 햇사과 한 상자를 준비할 때, 누군가는 과수원에서 직접 공수한 정직한 맛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한우 세트를 고를 때는 품질과 신뢰가 메시지가 된다. 최근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홍삼, 견과류, 비건 간식 같은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예전처럼 기름지고 무거운 고기만이 답은 아니다. 달라진 생활 습관이 추석 선물의 풍경까지 바꿔 놓고 있다.
추석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제사다. 제사상은 단순한 의례의 장식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기억의 무대다.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올리는 송편 한 그릇, 대추 몇 알에는 집안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도시화된 삶 속에서 이 전통은 점점 변형된다. 간소화를 택하는 집이 늘어나고, 제사를 대신하는 가족 식사가 보편화된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함께 모여 시간을 나누는 경험 자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추석은 동시에 귀향의 시간이다. 고속도로 위에 빽빽이 들어찬 자동차 행렬, 기차역에 넘치는 사람들. 이 귀향의 행렬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아니다. 도시와 시골,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거대한 사회적 의식이다.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가방 속에는 각자의 선물이 들어 있다. 그 선물은 단순히 소비의 산물이 아니라, 도시에서의 시간을 담은 흔적이며, 다시 시작할 일상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물은 늘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온다. 기쁨과 동시에 부담, 감사와 동시에 피로가 얽힌다. 누군가는 추석이 다가올수록 지갑을 걱정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형식적인 교환에 허탈함을 느낀다. 상업화된 선물 문화가 본래의 의미를 가린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선물을 준비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선물은 여전히 관계를 확인하고, 끈을 이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추석 선물은 시대의 거울이기도 하다. 산업화 시기에는 쌀과 라면이, 경제가 성장한 뒤에는 고급 과일과 수입 과자가, 최근에는 건강식품과 친환경 상품이 주류를 이룬다. 선물의 종류는 바뀌지만, 그 근본에 있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어떻게 해야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올려야 상대가 진심을 느낄 수 있을까.
한가위는 풍요의 절정이자 동시에 나눔의 계절이다. 선물은 풍요를 나누는 방식이며, 그 행위 자체가 공동체의 리듬을 유지한다. 그렇기에 선물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시대와 사람, 집단과 개인을 연결하는 오래된 언어다.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거리를 좁히며, 관계를 이어간다. 그리고 해마다 같은 질문과 망설임 속에서 다시 한 번 선물을 고른다. 그것이 한가위의 무게이자, 오래된 언어의 힘이다.